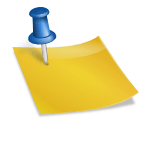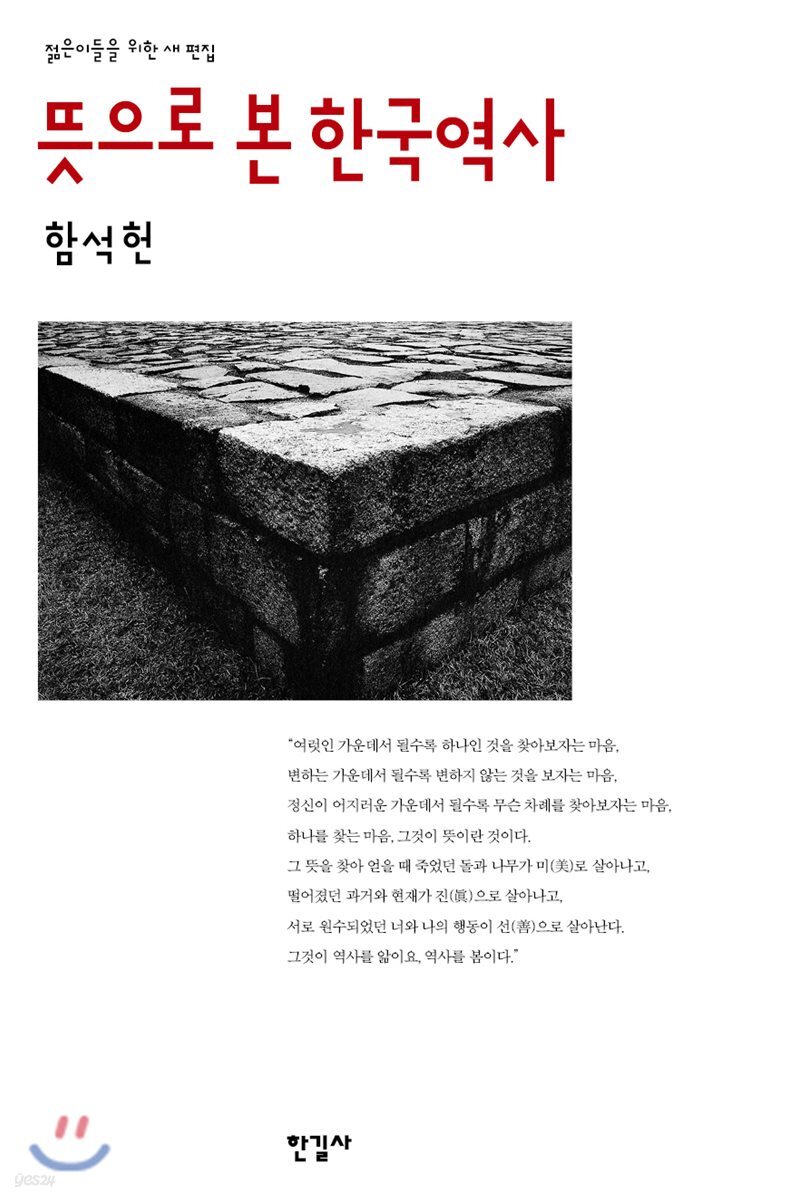지난 2000년 동안 가장 큰 화산 폭발은 백두산에서 발생했습니다.946년 밀레니엄 분화(Milleniumer uption)입니다. 당시 백두산에서 날아간 화산재는 일본 홋카이도 혼슈 북부를 지나 쿠릴열도 해저 그린란드 빙하 속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마지막 분화인 1903년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분화는 없었지만 2000년대 들어 분화 징후가 증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백두산 화산은 다시 분화할까요? 인류 문명을 집어삼킨 화산 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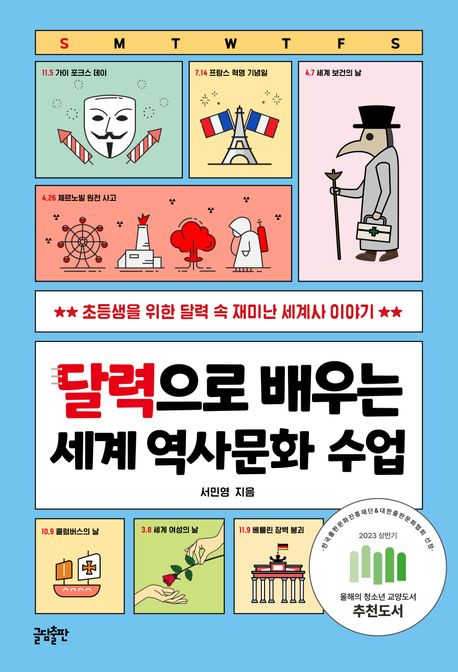
화산 폭발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나 화산 폭발은 인간의 문명과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흥망을 좌우했습니다. 7300년 전에 발생한 일본의 기카이 화산 폭발은 큐슈 남부로 흥한 조몬 문화를 전멸시키고 3500년 전 상토리ー니 테라야 마 분화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당시 지중해를 장악했던 미노스 문화를 전멸시켰습니다. 침몰한 아틀란티스의 전설도 테라 산 화산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서기 79년 폭발한 베수비오 화산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던 폼페이를 멸망시키면서 걸프의 바닷물 온도를 높이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18세기 말인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 폭발은 프랑스 혁명을 촉발하고 유럽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8개월 이어진 폭발이 대규모 흉작을 유발하고 가난과 기근이 심화되면서 프랑스 국민이 봉기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2010년 같은 지역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유럽 전체가 불안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815년 인도네시아 탄보라 화산 폭발은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췄습니다.946년 폭발한 백두산 폭발은 이 2000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백두산 대 폭발의 비밀>(사이언스 북스, 2010)의 저자 서울·원주 박사는 “백두산 테뿌라(화산이 분출한 화산 쇄설물)의 평균 용적을 100㎦으로 계산하면 10세기 백두산은 단 한번의 분출에서 한국 전체를 1m높이에 퇴적시킬 수 있는 화산물을 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폼페이를 삼킨 베수비오 화산이 50개 정도 분화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역사적으로도 『 고려사 』에 “고려 마사무네 원년(946년)하늘에서 고동 소리가 들리고 사면했다”라는 기록이 있어 화산 분화가 실제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백두산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는 동해를 건너 일본까지 날아간 것으로 나타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 『 흥덕사 연대기 』에는 “946년의 화산재가 마치 눈처럼 쏟아졌다”,”일본 표기”에는 947년 2월 7일에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홋카이도, 도호쿠 등 일본 북부에는 백두산에서 뿜어 낸 화산재가 쌓인 지층이 존재합니다.1992년 도쿄 도립 대학의 화산 학자 마치다 히로시는 백두산 폭발로 발해가 쇠약해졌는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발해 멸망의 시기는 926년인데, 백두산은 대폭발을 일으킨 수십년 전부터 분화하기 시작하여에 의해서 농작물의 냉해와 기근으로 민심이 동요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카이 세이국으로 불렸던 발해가 하루 아침에 멸망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란의 역사 책<기숙사사>에는 “발해의 『 민심이 멀어졌다 』(리심)의 틈을 노리고 싸우지 않고 이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란의 야률 아보기가 발해의 부여 성을 포위한 지 3일 후(926년 1월 3일), 성을 함락시킨 후에 남긴 기록입니다. 백두산, 또 폭발할까?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은 1903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폭발은 없었지만, 2000년대 들어 폭발 징후가 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활화산이니 언젠가 다시 폭발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문제인 거지만. 백두산 화산 폭발은 조선 왕조 실록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1420년 1668년 1702년 1903년에도 기록이 있으며, 마지막 폭발인 1903년 이후 폭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식 기간이 길었던 만큼 폭발 규모가 크다는 불안한 예측도 있습니다.<암석학 회지>에 의하면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은 2002년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6월 중국 동북부에서 지진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한 후 백두산 지역에서 화산성 지진이 급증했습니다. 그 뒤 2003년에는 백두산에서 균열·붕괴, 산사태 등이 자주 발생하고 2004년에는 백두산 지역의 숲에서 마른 나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의 틈새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전조 현상은 2003년 172회 2004년 158회 2005년 221회까지 감지되고 2006년 이후 안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심하려면 빠릅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를 이용한 분석 결과 2002~2007년에 천지 주변이 10㎝이상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런 현상으로만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산 폭발 주기설에 의하면, 화산 폭발은 큰 주기는 1,000년 작은 주기는 100년 세부 주기는 12~13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말인데 백두산은 지금 이 3주기가 겹쳐사실에 화산 학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다시 백두산이 폭발해도 1000년 전의 대폭발 같은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세기의 백두산 대 폭발 같은 규모의 화산 폭발은 수천년에 한번은 일어나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폭발한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북한은 백두산의 연구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백두 야마키타 영국 미국 연구진”의 일원으로서 국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기상청이 부산 대학교 내에 “화산 특화 연구 센터”를 개설하고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이곳에서는 백두산 △ 화산 가스 변화 △ 지표 변위 발생 △ 온천수 온도 변화 등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죠. “한중 백두산 공동 관측 장기 연구”를 통해서 백두산을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 화산 가스 등 실측 데이터를 채집·분석하면서 원탐사를 이용하고 △ 백두산 화산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백두산 분화 대응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내의 백두산 화산 폭발의 연구는 초보라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화산 폭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추정에서 폭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폭발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북한은 백두산 연구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백두산북영미중연구그룹’의 일원으로서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기상청이 부산대학교 내에 ‘화산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두산의 △화산가스 변화 △지표 변위 발생 △온천수 온도 변화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합니다. ‘한중 백두산 공동관측 장기연구’를 통해 백두산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화산가스 등 실측 데이터를 채집·분석하고, 원탐사를 이용하여 △백두산 화산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백두산 분화대응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내 백두산 화산 폭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화산 폭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추정으로 폭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폭발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북한은 백두산 연구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백두산북영미중연구그룹’의 일원으로서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기상청이 부산대학교 내에 ‘화산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두산의 △화산가스 변화 △지표 변위 발생 △온천수 온도 변화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합니다. ‘한중 백두산 공동관측 장기연구’를 통해 백두산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화산가스 등 실측 데이터를 채집·분석하고, 원탐사를 이용하여 △백두산 화산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백두산 분화대응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내 백두산 화산 폭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화산 폭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추정으로 폭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폭발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북한은 백두산 연구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백두산북영미중연구그룹’의 일원으로서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기상청이 부산대학교 내에 ‘화산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두산의 △화산가스 변화 △지표 변위 발생 △온천수 온도 변화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합니다. ‘한중 백두산 공동관측 장기연구’를 통해 백두산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화산가스 등 실측 데이터를 채집·분석하고, 원탐사를 이용하여 △백두산 화산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백두산 분화대응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내 백두산 화산 폭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화산 폭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추정으로 폭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폭발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북한은 백두산 연구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백두산북영미중연구그룹’의 일원으로서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기상청이 부산대학교 내에 ‘화산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두산의 △화산가스 변화 △지표 변위 발생 △온천수 온도 변화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합니다. ‘한중 백두산 공동관측 장기연구’를 통해 백두산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화산가스 등 실측 데이터를 채집·분석하고, 원탐사를 이용하여 △백두산 화산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백두산 분화대응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내 백두산 화산 폭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화산 폭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추정으로 폭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폭발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북한은 백두산 연구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백두산북영미중연구그룹’의 일원으로서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기상청이 부산대학교 내에 ‘화산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두산의 △화산가스 변화 △지표 변위 발생 △온천수 온도 변화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합니다. ‘한중 백두산 공동관측 장기연구’를 통해 백두산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화산가스 등 실측 데이터를 채집·분석하고, 원탐사를 이용하여 △백두산 화산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백두산 분화대응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내 백두산 화산 폭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화산 폭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추정으로 폭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